
'인디'와 '스타트업'이 살아야 한다.
우리 기름기 빼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인디 좋다. 인디 게임이 성공해야 개발자의 꿈을 꾸는 이들도 많아진다. 게임업계의 풀뿌리 산업이 인디 씬이라 할 수 있으니 인디는 살아나야 한다. 스타트업도 좋다.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져야 창업을 꿈꾸는 창의적 인재들도 덩달아 늘어난다.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 보여야 배짱만 있는 이들이라도 올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누구 못지않은 열정으로 열심히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진짜' 인디개발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분명 있다. 살아나고, 성공해야 할 이들이 바로 이런 이들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게임 개발을 쉽게 보고 뛰어드는 이. 눈 먼 지원금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인디씬에 들어온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인디 게임 행사는 늘 반쯤의 의심과 함께했다. 모든 출품작이 우수할 수는 없을 거라는 현실을 고려한 채, 숨어있는 보석을 기대하면서 취재를 나섰다. 솔직히 말해 이번에도 그랬다. 'GTR'은 일단 '인디'와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지원한 작품들 중 심사를 거쳐 20종을 선발한 후, 오프라인 행사에서 10종을 다시 가려 선발된 게임에 여러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무리 가리고 가려 뽑은 20종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20종이 다 좋을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추석을 삼일 남겨둔 월요일 아침, 부산 문현동에 위치한 GTR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세 번 놀랐다.
'인디'행사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것은 행사인가, 파티인가.
가장 먼저, GTR이란 행사의 분위기에 놀랐다. 지금까지 인디 게임 행사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디 게임 행사는 구성 면에서 다른 게임쇼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 비즈니스도 하고, B2C도 하고, 시연석도 마련되어 있으며 심지어 시상식도 진행한다. 물론 순수한 규모에서 인디 게임 행사가 거대 게임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색은 다 갖추기 마련이다. 아마 '인디라고 꿀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GTR은 전혀 그렇지 않다. 행사장은 거짓말로도 크다고 할 수 없는 공유 오피스고, 발표석은 오피스 한켠에 마련된 가로세로 2M 크기의 화이트 스크린이다. 심지어 발표석 앞에는 소파와 카우치로 꾸며진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데, 발표나 강연 중에도 버젓이 그곳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눈다. 스케쥴이 멈추면 다들 한켠에 준비된 샌드위치와 김밥을 집어다 먹고, 또 시간이 되면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게임 행사라기보단 파티같다고 해야 할까. 기자로서는 꽤 쉽지 않은 취재 환경이었다. 대다수의 게임 행사는 일종의 '취재 편집점'이 있다. 이쯤되면 한 번 끊어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의 워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나 GTR은 마치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순서가 넘어가고, 어떤 발표는 짧은가 하면, 또 어떤 발표는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다 보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기사 작성을 포기하고 가만히 행사를 즐기기로 마음먹자, 눈앞의 광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이보다 더 '인디스러운' 행사가 있을까? 북유럽, 동남아, 미국, 한국. 세계 각지에서 모인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의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또 감탄한다. 행사 이튿날 오후면, 이 중 열 종의 작품이 가려질텐데도, 이들은 아무 라이벌 의식이나 장벽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자들이 서로 낯가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GDC'와 같은 대규모 국제 게임 컨퍼런스를 제외하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심지어, 다른 인디 게임 행사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이게 진짜 '인디'게임인가?
무슨 게임 퀄리티는 또 이렇게 좋은가.
행사 분위기에서 한 번 놀랐다면, 두 번째로 놀란건 출품된 게임의 퀄리티다. 여기서 나는, 내가 내심 '인디'라는 단어에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전적 의미로 '인디'가 독립 자본으로 제작된 게임의 통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발된 게임 중 인상깊은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AAA급 게임 위주로 취재하는 내 성향도 문제가 있겠지만, 인디 게임 씬에 정직한 개발자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크라우드 펀딩 도중 잠적하고, 기본도 안 된 게임을 내놓는 모습을 몇 번 보다 보니, 인디 게임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쌓여왔나 보다.
하지만, GTR에서 발표된 게임을 보면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해외 개발자들이 들고 온 게임까지 다 말하면 좋겠지만, 게임이 20종이니 한국 개발자들이 만든 5종의 게임만 잠깐 말해 보자. 부산 사나이 게임즈의 '원혼'은 기획에서 놀랐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과감함에 놀랐고, 쿼터뷰에서 섬뜩함을 주는 연출에 놀랐다.

미라지소프트의 '리얼 VR 낚시'는 VR 취재 좀 다녀 본 나로서도 처음 보는 배경 연출 수준을 보여주었다. 실사를 소스로 만들었는데, 실사같지가 않다. '크로노 소드'는 고퀄리티의 도트 애니메이션과 수준급 UX/UI에 놀랐고, '신비한 고양이 사전'은 딱 봐도 흥할 게임이었다. 마지막으로 '퇴근길 랠리'는 1인 개발 게임이라기엔 게임 디자인이 너무 정교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작품이 아니었다.
한국 개발자들의 게임만 말했지만, 해외 개발자들이 들고 온 다른 15종의 게임들도 만만치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었다. 딱 보고 '억' 한게 어디 나만의 감상이랴. 당연히 서로 말문을 틀 수밖에 없었다. GTR은 글로벌 행사이니만큼 부산에서 진행했음에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행사였는데, 영어가 다소 힘든 개발자들은 통역까지 부탁해가며 서로의 게임에 대해 묻고 답할 정도였다.

'GTR'은 진짜 개발자들을 도울 수 있나?
GTR의 현재, GTR의 비전
가만히 앉아 관객 모드로 행사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GTR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행사다. 하와이, 쾰른, 멜버른,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부산에 이르렀다. 그럼 매 년 10종의 게임들이 선정되었을 텐데, 첫 해 선정된 10종의 게임도 아직까지 GTR의 지원을 받고 있을까?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행사장에 오기 전부터 메일을 주고받던 사람. GTR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대니 우(우정석)' 대표다.

앞서 궁금하던 내용을 묻자,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금껏 진행된 GTR 행사가 카테고리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중 1회 폴더를 열자 1회 선정 개발자들의 대화가 주루룩 갱신되었다. 마지막 대화로부터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내친 김에 대니 우 대표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다. 실질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다.
GTR의 개발자 지원은 '퍼블리셔' 및 '투자자'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좋은 게임에 관심은 있으나, 섣불리 어떤 게임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과 개발자들의 만남을 중개하는 것이다. 한 번의 소개로 끝이 아니다. GTR은 몇 년 간 행사를 지속해오면서 다양한 끈을 만들었다.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퍼블리셔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GTR은 게임 시장의 3대 요소 중 개발사와 퍼블리셔를 뺀 다른 하나를 확보했다. 바로 '게이머'다. 'G.Round(그라운드)'가 그 결과물이다. 그라운드는 GTR과 함께 개발된 게임들을 게이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피드백과 응원을 받는 일종의 커뮤니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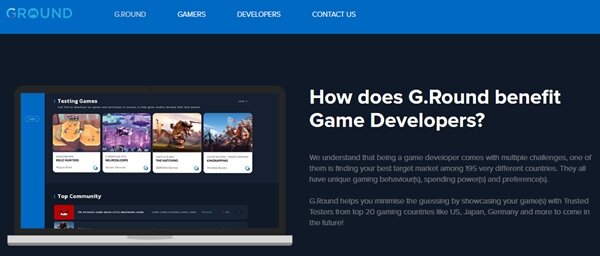
여기서 GTR은 데이터를 얻는다. 각국 게임 시장마다 형성된 그라운드는 각 시장의 특이점을 알려준다. 어떤 시장은 서브컬쳐가 강하고, 또 어떤 시장은 로그 라이크가 인기를 얻는지. 각 시장의 게이머 성향이 그라운드를 통해 정리되고, 이는 퍼블리셔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료가 된다.
대니 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인디 게임 시장이 그래요. 어떤 게임이 뜰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뜰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린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개발을 돕고, 게임에 딱 맞는 시장을 찾고, 이 데이터를 통해 의지 있는 투자자를 찾아내죠"
여기서 세 번째로 놀랐다. 인디 게임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은 언제나 진행중이지만, 사실 결코 쉽지 않다. 구성원 중 누구 하나의 의지만 부족해도 흔들리는게 인디 게임 시장이다. 모두가 노력해야 겨우 빛을 볼 수 있는 판국인데 그게 어디 쉬울까. 하지만 GTR은 이를 시스템화해 보완하고자 했다.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뼈대는 모두 잡혔고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이는 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최측이 시스템의 힘을 믿고 이를 우직하게 진행한다는 점에 놀랐다. 이쯤 되면, 행사 전 내가 품었던 반쯤의 의심이 참 되도 않은 것 아닌가. GTR. 참 여러모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사다.

